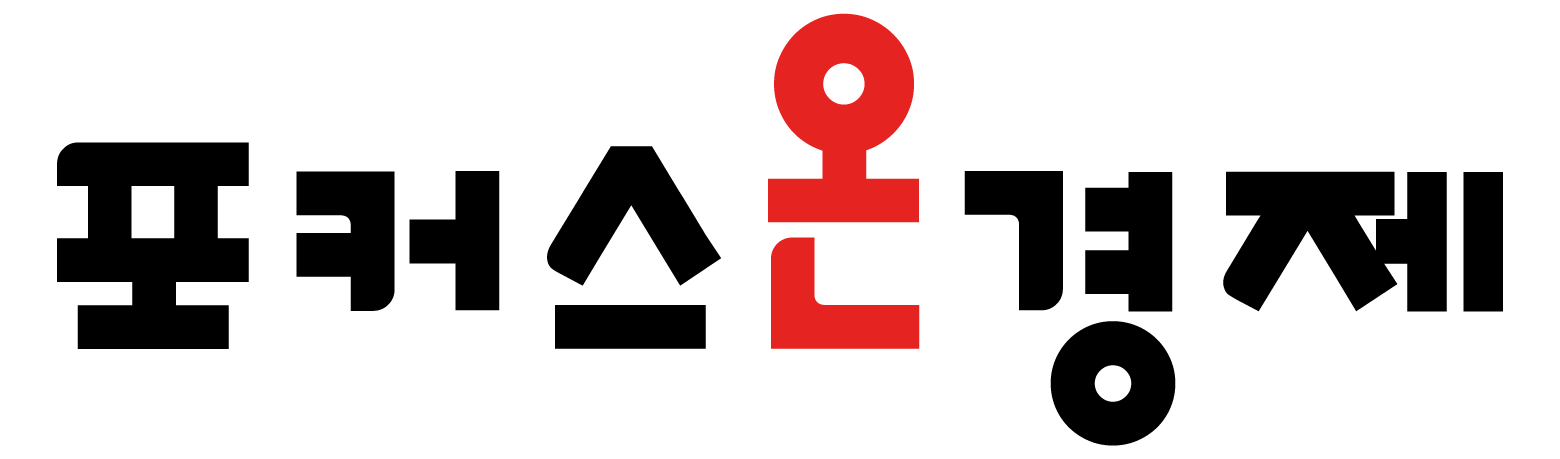- 문화순환 연구 공간, 논골담길 커먼즈

1회. 묵호로 가는 이유? 혼자니까 묵호다
작당들이 24시 문화 순환을 연구할 공간에 앉아 있다.
'논골담길 커먼즈'. 내가 직접 기획하고 이름까지 붙인 4평 공간의 하얀색 의자 위다. 골목을 타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딱 하나였다. 발소리가 하나뿐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다. 둘 이상이면 반드시 낮은 말소리라도 섞이기 마련이니까. 묵호를 혼자 걷는 사람은 말이 없다. 그 침묵이 겹겹이 쌓여 이 골목의 결이 되었고, 그 결이 지금의 묵호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로 만들었다.
참 묘한 일이다.
나는 묵호의 중심이 된 이 공간 논골담길을 기획한 사람이다. 2010년, 이 언덕에 처음 올랐을 때 여기는 누구나 찾는 명소가 아니었다. 빈집이 늘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그저 짠 오징어 냄새만 바람에 실려 다니는 동네였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훨씬 전이었지만, 이 골목은 이미 그 쓸쓸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나는 기획자라는 명함을 들고 그 냄새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
지금 나는 잠시 그 사실을 잊어보려 한다. 문화 기획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차가운 설계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동선, 시선이 머무는 곳,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감동은 어느 정도일지. 그런 계산을 내려놓고 그냥 여기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이 골목이 내게 다르게 말을 건다. 마치 내가 오늘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인 여행자인 것처럼.

사람들은 왜 하필 묵호에 혼자 올까?
이 질문을 꽤 오랫동안 머릿속에 품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묵호는 관광지로서 화려한 맛은 없다. 강릉이나 속초처럼 세련된 카페나 편의시설이 깔린 그것도 아니다. 여전히 낡았고, 비탈길은 가파르며, 바람은 거칠고 오징어 냄새가 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온다. 혼자서. 낡은 카메라 하나,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거리를 걷다가 내린 답은 이렇다.
묵호는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기어이 혼자가 되기 위해 오는 곳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천지 차이다. 위로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채워달라는 부탁이라면, 혼자가 되겠다는 건 내 안의 소음들을 비워내겠다는 단호한 선택이다. 묵호의 골목은 무언가를 채워주지 않는다. 그저, 마음껏 비워도 괜찮다고 가만히 등을 토닥여줄 뿐이다.
이 시대는 왜 이토록 비움에 목말라 있을까.
묵호로 향하는 발걸음은 일반적인 여행의 유행이 아니다. 24시간 연결된 지치고 피로한 사회에서 '나 홀로'라는 상태를 외로움이 아닌, 내 의지로 선택한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길을 떠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묵호는 그 마음에 딱 맞는 풍경을 내어준다. 세련되지 않아 오히려 솔직하고, 번화하지 않아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 앉을 수 있는 곳.' 혼자니까 묵호다.' 이 말은 그래서 나왔다.

'논골담길'도 그런 비움의 공간이길 바랐다. 처음 이곳을 구상할 때 가장 겁냈던 건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다. 마을 재생이라는 번지르르한 이름 아래 수많은 골목이 천편일률적인 벽화로 덮이고 억지스러운 포토 존이 생기는 걸 너무 많이 봐왔다. 그것들은 대개 주민을 위한 그것이 아니었다. 관광객을 위한 무대였고, 그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배경이나 소품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공간을 기획한다는 건 결국 윤리의 문제다. 어떤 이야기를 살리고, 어떤 기억을 지울 것인가. 누구의 삶을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기획은 곧 긍정 권력을 나누는 일이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를 낳는 건, 대개 그 권력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골목에서 그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고 싶었다. 내 노력이 성공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마 이 연재가 끝날 때쯤에도 정답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
발소리가 멈췄다.
공론장 커먼즈 입구에 서른쯤의 여자가 서 있었다. 배낭 하나, 카메라 하나. 그녀는 선뜻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참 동안 입구를 바라보다가, 다시 천천히 골목 북쪽 어달, 대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무엇을 비우러 이 먼 묵호까지 왔을까. 그리고 이 투박한 골목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여백을 허락해 주었을까.
묵호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항구다. 정답을 툭 던져주지는 않지만, 질문을 오랫동안 품고 있을 힘을 준다. 공간은 완성되는 순간 기획자의 손을 떠난다. 그 뒤로는 공간과 사람이 만나는 수많은 우연이 그곳의 의미를 매일 새롭게 써 내려간다. 나는 2010년부터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 골목은 살아남았다.
나는 다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기획자로서의 나와, 그저 쉬러 온 방문자로서의 내가 슬며시 겹친다. 그 겹친 마음이 바로 이 연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항구는 혼자 오는 사람을 기억한다. 나는 이제 그 기억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러 왔다.
<편집자주>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런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자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