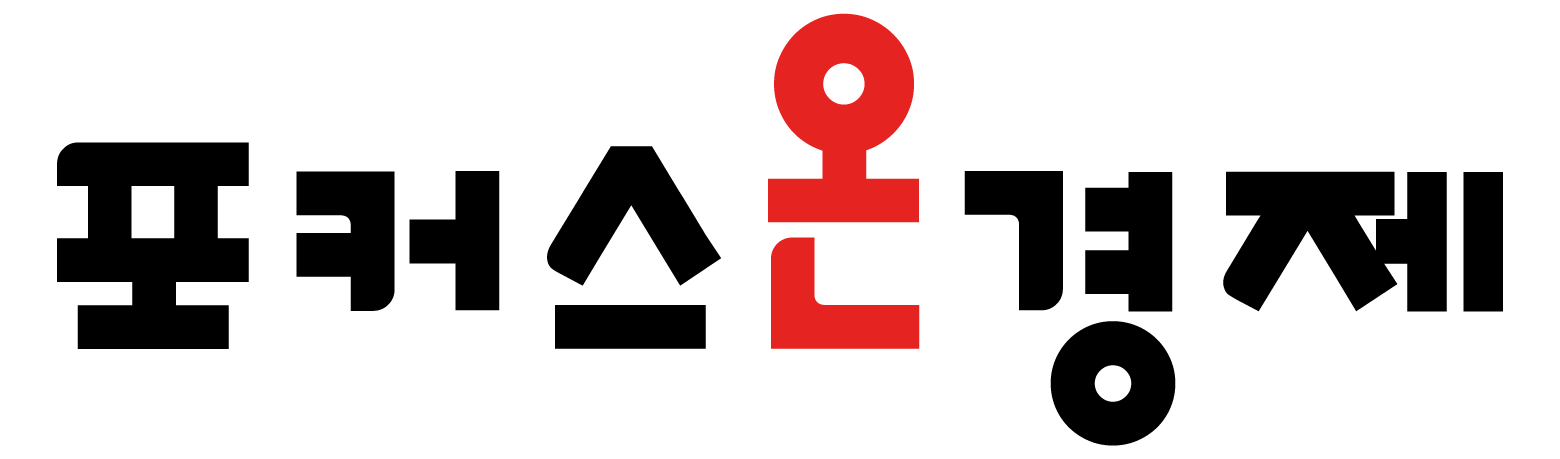- 혼인 건수도 9년 만에 최대⋯정부 정책·인구 구조 변화 맞물려
- 사망자 수 여전히 출생아 웃돌아 7월 인구 6천여 명 자연 감소

혼인 증가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7월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3명(5.9%)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4명 상승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 대비 8.4% 늘어 2016년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출생아 수를 상회해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미니해설] 7월 출생아수 4년 만에 최고치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구통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3명(5.9%) 늘었다. 이는 2021년(2만236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2만명대를 유지해왔으나, 6월에 다소 주춤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했다. 특히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나타난 반등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혼인 건수 증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그리고 출산 적령기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인구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단기적인 변동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구조적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소폭 개선됐다. 7월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4명 높아졌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은 61.9%로 1.6%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아(31.4%)와 셋째아 이상(6.7%)의 비중은 각각 1.6%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출산이 여전히 '한 자녀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반면, 광주와 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주거 안정 지원, 보육 인프라 확대 정책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달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보다 1583건(8.4%) 늘었다. 이는 2016년 7월(2만1154건)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은 작년 4월 이후 1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결혼 수요와 정부의 주거·세제 지원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구 전반의 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출생아 수를 웃돌았다. 이로 인해 7월 한 달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심화와 사망자 증가가 구조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년 전보다 113건(1.4%)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요인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출생아 증가세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반등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이 줄어드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의 과제는 출산·양육 비용 완화,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 다층적 정책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 전반의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자연 감소 추세를 감안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통계는 출생아 수가 장기간 감소해온 흐름 속에서 일정 부분 반등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구조적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증가세를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